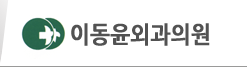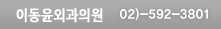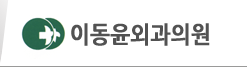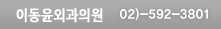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
|
 |
 작성자 작성자 |
 |
이동윤 |
 작성일 작성일 |
 |
2003.02.24 |
|
|
 첨부파일 첨부파일 |
 |
|
|
|
|
 |
발/신발, 그 접촉면(2) Guten(1997) |
2.달리기용 신발
가.역사적 고찰: 신을 것인가 아니면 신지 말아야할 것인가
1932년 5톤 바위밑에서 발견된 오레건주의 한 동굴에서 고고학자인 Luther Cressman이 찿아낸 샌들은 약 10.000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신발들은 끈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쑥나무 껍질을 꼬아 만들어졌다. 마찰력을 높리기 위해 바깥창에 이랑이 만들어졌다. 전족부가 덮힐 수 있는 덮개가 있었으며, 뒤쪽으로 뒤꿈치를 싸고있는 끈이 덧대어져 있었다.
이차적인 자료는 그 시절에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먹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달리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다른사람의 사냥감이 되지 않고 성공적인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달리기 주자가 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첫 올림픽에서 달리기가 필연성보다는 여흥과 스포츠의 형태였을 때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이것은 기원정 8세기에 있었다. 올림픽에서 가장 긴 레이스(장경이 3846미터였다)를 위한 출발선은 돌에새겨진 두개의 좁은 홈으로 만들어졌다. 주자들은 맨발로 달렸고, 아마도 발가락들을 출발 받침대로 사용되는 홈안에 넣었을 것이다. 이 시대에 그려진 화병의 그림에서도 역시 신발을 신지 않은 주자들이 묘사되고 있다.
로마 왕정이 시작되고 후에 강성해지면서 로마법령에 의해 올림픽이 금자되었던 기원후 393년경에 신발신고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로마군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주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한 황제가 주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단일창의 신발인 gallicas를 사용토록하는 칙령을 선포하였다. 비록 이 갈라카스가 현재의 신발과는 큰 격차가 있지만 주자를 위한 특별한 요구에 대한 초창기 아해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1839년까지: Charles Gooyear이라는 남자가 나무에서 추출한 생고무를 가열하여 황산과 섞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무로 알고잇는 유연한 물질을 창조하였다. 이 물질의 독특한 응용중의 하나가 달리기용 신발에 사용한 것이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전의 단단한 밑창의 신발에 비해 훨씬 더 쾌적한 스포츠를 가능하게 하였다.
1965년 경에 특별한 달리기용 신발이 제작되었다. Spalding catalog 및 이후의 Sears catalog들은 그 당시 주급의 거의 1/4에서 1/2에 해당하는 3달러에서 6달러까지의 가격으로 주문이 가능한 달리기용 신발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Adi Dassler는 1948년 Addidas회사를 만들어 독일에서 달리기용 신발들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그의 형제인 Rudi는 Puma Company라는 라이벌 회사를 차렸다. 형제간의 불꽃튀는 경쟁이 달리기용 신발의 혁명을 가장 확실하게 선도하였다.
1951년에 일본인이 만든 Tiger Marathon shoes가 시장에 나왔다. 엄지발가락과 다른 네 발가락이 분리된 첫 달리기용 신발이 출시되었고, 이들은 게다라는 일본 전통 신발의 모델이 되었다.
1906년 보스톤 지역에서 New Balance가 정형외과적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초에 그 때까지의 지식을 이용하여 달리기용 신발을 만들기로 하였다.
10년 후인 1972년에 Nike가 타이거 신발 대리점을 그만 두고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1972년은 프랭크 쇼터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해이기도 했다. 그가 신었던 신발은 한 켤레의 트랙용 스파이크에서 밑창을 제거하고 단일층의 중간창물질을 아교로 신발에 접착하였다. 그리고 나서 바깥창을 중간창에 접착시켰다.
미국에서 스포츠로써의 달리기가 증가하면서 달리기용 신발의 시장을 나누어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증가되었다. 신발 검사와 신발의 생역학적 검사가 일반화 되었다. 달리기 역학과 달리기 신발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을 설명함으로써 스스로를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고기술의 달리기용 신발을 신지않고 달리러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의 달리기에 대해 생각하게 한 순간이 있었다. 최근의 올림픽 마라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베베 비킬라가 맨발로 달리는 것을 보앗다. 우리가 알고있는 한 그는 신발을 신고 훈련을 받지않았으며, 그의 첫 올림픽 참가대회에서 신발을 신은 사람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그러나 그의 두 번째 마라톤 대회에서는 그도 신발을 신었다.) 멕시코의 Copper Canyon에 사는 Tarahumara인디언들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수일동안 계속 달리며, 100-200 마일의 바위로 된 잡다한 트랙 으로 구성된 라르지파로(rarjiparo)를 달린다. 이 인디언들은 영양들이 피로로 지쳐쓰러질 때까지 그들을 쫓아 달림으로써 사냥을 한다. 이들은 트럭타이어로 만든 샌들을 신고서 이런 놀랄만함 묘기를 달성한다.
우리가 알고있는 달리기용 신발의 구성요서들을 기술하면서 우리는 말기 빙하기 이후로 코퍼캐년의 인디언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능적인 달리기용 신발을 가지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나.달리기용 신발의 구조
달리기용 신발의 목적은 체중부하를 흡수하고 발을 조절내지는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한 신발은 어디에도 없다. 달리기 부상의 대부분과 그에 따른 치료는 신발의 이 두 가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신발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은 임상의들에게는 중요하다.
신발은 덮개와 밑창의 기본적인 두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덮개는 발등과 양 옆을 덮는 부부이고, 밑창은 발과 지면 사이에 있는 부분이다.
신발의 앞닫이(vamp)는 갑피의 앞부분으로 전족부를 덮는 신발부위이다. 발가락 통(toe box)는 앞닫이의 앞쪽에 있으며, 끈까지 연결되는 가죽으로 덮어씌운 부위이다. 이 덧씌움을 날개끝(wingtip)이라고 한다. 만약 가죽덧씌움이 신발끈까지 덮지 못할때를 흙받기 끝(mudguard tip) 혹은 모카신 발가락 통(moccasin toebox)이라 부른다. 신발목(throat)은 신발끈 주위의 신발부분이며, 칼라(collar)는 발과 접촉하는 덮개 주위 측면의 패딩된 부위를 말한다. 신발 뒤쪽에는 뒤축(heel count)과 아킬레스 보호기(Achilles tendon protector)혹은 당기는 손잡이(pull-tab)이 있다. 뒤축은 후족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단단하게 되어있다. 두축을 손가락으로 양쪽으로 쥐어짜면 신발의 내구성을 알 수가 있다.
신발맡창의 가장 바깥쪽은 바깥창(outsole)으로 주로 마찰력과 내구성을 가지며, 쐐기(wedge)는 바깥창의 위에 얹히는 부분으로 뒤꿈치를 높히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된다. 뒤꿈치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햐서 0.5인치 정도 높게 디자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중간창(midsole)의 목적은 체중부하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다. 과거 25-30년 동안 산발디자인에서의 주요 변화는 중간창과 쐐기의 개발이었다. 1970년대에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thylene vinyl acetate)와 같은 중합체의 거품덩어리가 신발설계에 적용하는 시각이 다듬어졌다.
내구성 접착제로 붙인 신발에서는 신발의 다음 창이 안창(insole)이다. 안창판은 발의 움직임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시키지 않으면서 적당한 산발바닥의 딱딱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유연성이 특히 강조되는 부위는 전족부의 중족골지절관절 부위이다. 도약시에 중족골지절관절의 약 25-30도 배굴된다. 만약 신발의 유연성이 불충분하면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다.
양말선과 안창은 심발과 발이 만나는 부분이다. 이 부위는 땀을 흡수하고 발바닥 쓸림이 없이 약간의 잘라내는 듯한 뒤틀림이 일어나는 동안의 하중을 흡수하여야 한다.
일부 신발에는 발의 아치부분에 아치쿠키(arch cookie)가 있다. 이것은 거품이 많은 고무로 만들어지며, 과회내를 최소화시키 위해서이다.어떤 주자들은 이런 신발을 좋아하지만, 믾은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끼기가 힘드기 때문에 들어내버린다.
신발의 뒤꿈치는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 신발의 모양이 변함에 따라 이 귀꿈치의 벌어짐도 같이 변한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넓게 뒤꿈치가 벌어지면 발이 너무 빨리 회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제화
신발생산과정은 노동집약적이다. 신발이 생산 라인을 떠나기 전에 약 25명의 손길을 거쳐야된다. 신발을 만드는 과정들의 하나는 신골에 신을 넣는 것이다. 신골은 금속이나 나무로 된 만들고자 하는 신발의 모형이다. 신발 산업에서는 아주 강력한 비밀이다. 신골은 신발의 기본 설계를 좌우하며, 신발의 안락함과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 네가지 기본 신골이 있으며, 사용하는 신골의 형태는 신발바닥의 외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쉽다.
신골의 만곡도는 신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다. 휘어진 정도가 직선에서 휘어짐까지 연속적이다. 직선 신골을 사용한 신발은 전족부 내전이 없다. 이런 신발은 발의 가장 내측부 지지를 제공하며 과회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골이지만, 일부 주자들에게는 신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휘어진 신골을 사용한 신발은 내측 방향으로 최대로 벌어짐으로써 내측지지가 가장 낮다. 휘어진 신골의 신발은 직선신골보다 유연성이 더 좋다.
신발은 세가지 기본적인 방법으로 신골의 밑바닥과 이어진다. 제화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안창을 제거하고 살펴보는 것이다. 판지로 된 신골이거나 접합제로 된 신골의 신발은 덥개가 신골을 덮어씌우고 있으며, 안창판에 접합되어 있다. 안창판은 안창 아래쪽을 볼면 볼 수 있다. 신골이 판지로 된 신발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보장구가 얹히는 단단한 받침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안정성(과 안정성의 수명)은 안창판이 마분지나 마분지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지고 아주 빨리 부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천으로 된 슬립형 신골은 안창 아래쪽이 밑이 평평한 노루가죽신(moccasin)과 같아 보인다. 슬립현 신골의 신은 덮개가 밑바닥과 통째로 꿰매져 있으며 신골을 끼우고 있다. 이런 형태의 제화는 신발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조합형 신골의 신발은 뒤꿈치 쪽은 안정성을 위해 판지형 신골을 사용하고 앞꿈치 쪽은 유연성을 위해 슬립형 신골을 사용한다.
라.신발이 발에 미치는 효과
발에 대한 신발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De Clercq등이 뒤굼치의 변형에 대한 연구에서 맨발로 달리는 사람들의 약 61%에서 뒤꿈치 변형이 오는데 비해 신발을 신으면 단지 36%에서만 뒤꿈치의 변형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이론적인 결론은 신발이 외력의 일부를 흡수하며, 더 넓은 표면적에 걸쳐 외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중간창의 기능은 달리는 동안 하체에 걸리는 하중을 흡수하는 것이다. 만약 부드러운 물질이 중간창의 재료로 사용되면 충돌지점의 아래쪽에 있는 물질에만 충격력의 대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지점 탄성력(point elastic)이라 부른다. 반대로 더 단단한 물질이 사용되면 더 넓은 표면적에 걸쳐 충격력을 분산시키며, 이를 표면 탄성력(surface elastic)이라 부른다. 그러나 중간창 경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Komi와 동료들은 지면 반응력이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만큼 신발의 재료에는 의존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NIgg등은 중간창의 경도가 외측의 수직 충돌력의 강도와 체중부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점성과 탄성을 지닌 신발 안창은 외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했다. Clarke등은 최대 수직 충돌력의 강도가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신발 경도의 차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부드러운 신발일수록 최대 충돌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Cook등은 약 40 모델의 신발을 0-500 마일까지 사용후의 충격흡수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다. 모델들 사이에 따른 뒤꿈치 충격시의 에너지 흡수율의 차이는 아주 적었다. 뿐만 아니라 품평시험에서 신발의 사용 거리가 증가할수록 뒤꿈치에서의 충격흡수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직접 신고 뛰는 것과 같은) 야전시험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Clarke등은 품평검사와 에너지 판 검사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품평시험은 발과 신발 사이의 힘을 측정했으며, 에너지 판은 신발과 에너지 판사이의 힘을 측정했다. 발과 신발 사이의 실질적인 접촉면에 대해 후자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험상의 실수가 분명히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달리는 동안 뒤꿈치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압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품평시험(뒤꿈치 압박)과 야전시험(최소한의 뒤꿈치 압박)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단순히 품평시험은 뒤꿈치를 시험한 것이고 야전시험은 전족부를 더 많이 검사하고 뒤꿈치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흡수력과 안정성/움직인 조절력 사이에는 분명한 역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역시 흥미롭다. 주어진 움직임의 많은 부분이 뒤꿈치를 통하여 조절되지만 에너지의 흡수는 전족부에서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미래의 신발은 뒤꿈치 아래나 주위는 더 딱딱하게 하고(후족부 조절력을 제공), 전족부는 더 쿠션이 좋게(충격력을 흡수) 설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것은 신발 뒤꿈치의 0-60%에서 충격력에서 발을 보호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가과 배치되지만, 가장 큰 에너지와 압력을 받는 전족부 아래쪽에 설계의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지지를 받을 것이다.
후족부와 중족부 착지자들을 위한 신발을 따로 설계하는 의견도 있지만, 최대 압력은 초기 접지의 형태나 주자의 속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