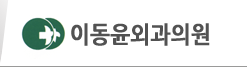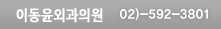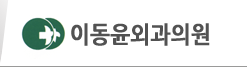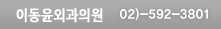일상을 살아가면서 대응하게 마련인 외부 세상에 대한 상호작용을 인내심이라 부른다. 이런 능력은 대부분 어릴 적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 경험을 통해 결정되며, 반복적인 삶의 습관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아지거나 확대되기도 한다.
인내심이 넓은 사람들은 '신경지'라 불리는, 무의식적 '생존뇌' 과정인 안전과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서 안전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한결같이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생각뇌'의 기능을 가동해 도전적인 경험에 대처한 후에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면한 위험에 온통 주의를 빼앗기지 않으며, 현재의 전반적 환경 정보를 더 잘 소화할 수 있다.
힘든 시간을 겪는 동안에도 상황의 흐름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인내력이 넓고 강했던 사람들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외상 환경에 시달리며 회복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심의 한계가 좁아진다.
심신 체계를 잠시도 쉬지 않고 '항시 가동' 상태로 운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회복 탄력성이 점차 약해지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와 현대 세상의 흐름은 불일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불일치한 환경적 한계 때문에 구석기 시대의 인내심의 배선을 디지털 사회의 현실적 생물학적 구조를 조율하려는 의식적, 의도적 노력 없이 신체 자체의 무의식적 본성 장치에 자동으로 맡기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인내심의 창문 넓이가 좁아질수록 창문 밖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인내의 창 밖에서는 생각뇌와 생존뇌가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충동적인 한쪽 뇌가 안정 지향의 다른 쪽 뇌를 무시하거나 침묵시키려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과 신체감각, 몸의 욕구와 한계를 구획화하고 억압하려는 생각뇌의 무시 또는 치환을 경험하게 된다. 감정과 고통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충동적이고 반작용적 선택을 하는 생존뇌의 도용과 치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 음식이나 카페인, 담배, 다른 물질, 중독, 폭력, 자해, 아드레날린을 추구하는 헹동을 자가 처방하거나 고통을 감추려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무엇보다 인내의 창 밖에서는 우리가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요즘 우리 사회처럼.
지금의 우리 상황은 일종의 사전지정운용제도처럼,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내려는 단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자신의 인생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믿고 있는 많은 전략들은 사실 스트레스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상의 삶에서는 이런 일반적 습관들, 즉 사고의 구획회, 억압, 무시, 주의분산, 긍정적이거나 그리 나쁘지 않다는 식의 재구도화 방식으로 본래의 사고 방식을 유지하려 하거나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으로 조절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며, 변경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호와 단서들을 놓치게 만들며, 우리 자신이나 지지적 관계와 단절하게 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된다.
우리 뇌와 신체의 신경 생물학적 구조는 심신 체계의 고유 부분들이 기술과 능력, 그리고 통찰력을 지닌 응집력 있는 전체로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각뇌와 생존뇌가 협력해서 작동할 때만 이런 잠재적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