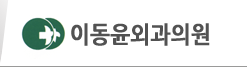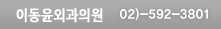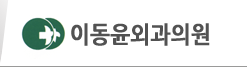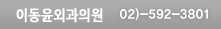부처님의 중심 주제는 행복이었다. 어떻게 하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일관하셨던 것 같다. 즉 부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행복의 노하우였지, 철학도, 학문도 아니었다.
일상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 또는 그런한 상태의 행복은 일반적으로,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거나 희망을 그리는 좋은 감정의 심리적이면서 이성적인 마음 상태가 행복감이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면과 함께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남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 행복으로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괴로움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적으로 접근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실천적인 문제의식에서 보았을 때는 단지 하나, 즉 괴로움으로부터의 탈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 대한 네 가지 진리'에 집약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길을 밝혔을 뿐, 그 밖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학자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석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불교 이론들에는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 혹은 사성제(四聖諦)라고 한다. 괴로움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뜻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苦)'라는 한자말은 고통, 고뇌라는 주관적인 감정의 뉘앙스가 강하다.
하지만 산스크리트어 원문인 'Dukkha'는 차축과 차바퀴 사이의 틈에 이상이 생겨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즉 무언가가 잘 흘러가지 않고 있는 상태, 즉 불만족한 상태, 어긋나있는 상태, 조화롭지 않는 상태, 안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괴로움이란 무언가 잘 안 돼 가고 있는 상태, 안정이 깨진 상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 가능하면 '고(苦)'라는 한자가 가진 고통이나 고뇌와 같은 주관적인 뉘앙스에 붙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의학에서 몸에 생긴 병을 고칠 때의 상황과 같은 것이다. 병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환자의 자각으로부터다. 환자 자신이 내 몸 어딘가가 이상하다고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런 자각이 있을 때 몸의 경우라면 병원에 가고, 마음의 경우라면 자신의 인생에 관해 다시 생각해본다거나 하면서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1단계의 알아차림"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알아차림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는가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아주 작은 조짐만으로도 자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채 병이 깊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
사회에서 줄곧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승진과 출세를 하던 사람이 정년을 맞아 삶의 목표를 잃고 정신이 불안정해지는 사례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현실에 너무 적응해 버린 결과, 자신의 삶을 폭넓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나이를 먹어버린 것이다. 그 반대로 유유자적한 사람도 있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