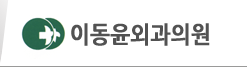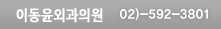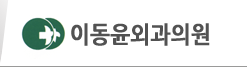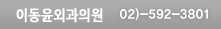일반적으로 시간은 총알처럼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워왔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낮과 밤처럼 순환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교육도 이와 비슷하여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전면으로 불러내려는 시도가 바로 교육이다.
지식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지 정보를 많이 모은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한 어떤 한 의견에서 시작해서 이성에 의해 지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새장처럼 스승들이 새장에 새들을 마구 집어넣듯 지식의 조각들을 끼워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반복하면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진정한 정신의 영원한 불빛 속으로 돌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의 진정한 본성, 늘 그곳에 있어왔던 깊은 수준의 우리 그 자체에 집중하여 지식의 조각들을 추가하기보다 진정한 우리 자신을 엄폐하고 방해하는 것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지혜는 그냥 무우라도 자를 수 있는 칼날이 있는 보통 칼과 같다.
하지만 잘 자르려면 칼은 날카로움이 필요하고, 날카로움은 칼이 잘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덕은 인간이 탁월하고 지혜롭게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그런 덕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강인하고 재빠른 상태로 몸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잘 살아가려면 인간 존재의 전체 중에서도 정신이 좋은 조건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조건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덕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덕이 많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 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역할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말은 사리사욕에만 급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에고에 과하게 갇힌 상태다.
덕이란 모든 의식 존재의 진정한 본성으로 인식되는 비개인적인 불성의 상태 혹은 지헤와 자비가 합일된 상태로부터 유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확고하게 자아가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집착이 이기적인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개인적인 에고에 대단히 집중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덕은 비록 사회적 자각과 관계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덕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은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며, 그것이 바로 해탈 혹은 열반이다. 기독교적 개념도 여전히 의미심장하지만, 불교적으로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불성 혹은 무아로 기독교적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늘도 흥겹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