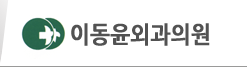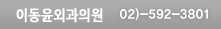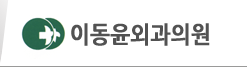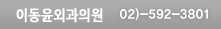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5귀절 반야심경2-3]반야(般若): 깨달음을 가져오는 화두법의 자세
'이뭣고' 화두 외에도 ‘뜰 앞의 잣나무’는 어떤 승려가 조주스님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祖師西來意)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한 대답이다. ‘삼 서근’은 “어떤 것이 부처인가?”라는 물음에 운문종(雲門宗)의 수초선사(守初禪師)가 한 답이며, ‘마른 똥막대기’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는 물음에 대한 문언선사(文偃禪師)의 답이다.
이렇게 화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문답에 대하여 의문을 일으켜 그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 화두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하며,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화두에 대한 의심을 풀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조선 중기의 고승 휴정(休靜)은 그의 [선가귀감 禪家龜鑑]에서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더운 기운이 늘 지속되고 있으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주린 때 밥 생각하는 것이나 목 마를 때 물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고 억지로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다."고 했다.
참선하는 데 있어 이렇듯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깨달음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다. 화두 공부에는 그냥 일념으로 간절히 참구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요령이 없다. ‘간절 절(切)’이야말로 화두를 드는 데 있어 가장 요긴한 것이다.
"먼저 몸과 마음을 다스린 후에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라"는 유교적 가르침처럼 참선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자세하고 정밀하게 공부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변함이 없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