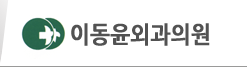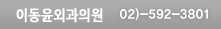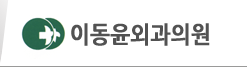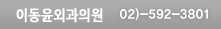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밝음과 어두움, 무거움과 가벼움, 둔탁함과 유연함, 지속적임과 단속적인 음성들이 분위기를 상승시키거나 약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하나의 율동 속에서 조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
목소리로 만들어진 사다리들들을 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며, 달콤하게 잦아들다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와 환희의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멸시와 조롱으로 슬픔의 상처를 감싸기도 한다. 서로 간의 이해와는 상관이 없다.
환희의 말들은 내면을 가득 채워 불길처럼 마음을 흔들어 밖으로 흘러나오려 비좁은 머릿속을 맴돌며 침묵 속에서 멈추려 하지만, 멈출 수 없게 된다. 세찬 바닷바람에 밀리는 나룻배처럼 계속 몰리듯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오늘도, 내일도, 이해되지 않은 채.
밤의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촉촉한 부드러움이 세상을 감싸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항상 빛이 흐르고 있다. 들리거나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은 그만의 음악으로 가득 차 울려퍼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세상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된다.
아무도 감히 그런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다. 일정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퉁명스럽고도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릴 뿐이다. 누구도 쉽게 그런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가 없게 된다. '아~!'하는 오직 한 마디만 남아 있다.
마치 거대한 도취 상태가 그들을 사로잡은 듯, 종교행사에서 합창단의 노래 속에 박자를 맞추고 있듯이 눈들이 무언가에 집중되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말이라도 걸라치면 깜짝 놀라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말로 횡설수설하곤 할 뿐이다.
일에 미친 사람들에게 한 마디라도 건냈다가는 성난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것이 뻔하다. 그런 시간들은 잊어버린 듯 낮과 밤도 구별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리듬과 박자라는 시간만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거칠게, 점점 더 절박하게 자기 내부에서 밖으로 솟구쳐 나오는 물살의 흐름에만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발걸음은 쾅쾅거리며 자신만의 박자를 맞추며 물살의 흐름에만 이끌려 간다.
노래하는 듯 하다가 실내를 걸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발이 부르터도록 달리기도 하면서 움직이고 또 이동한다.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창작의 폭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 고통을 받지도 않게 된다. 마지막 기도말처럼 넓고 풍부해 보인다.
오늘 한 일을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영원히 이해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은 음악으로 바뀌었지만,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말들이 마비된 육체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듯 어지러운 세상에도 말과 코러스가 함께 합해질 수 있길 기도할 뿐이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