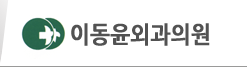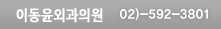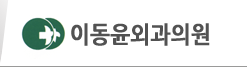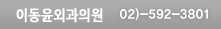[5귀절 반야심경 22] 역부여시(亦復如是): 역시 모든 것이 이와 같다
인간을 육신과 정신으로 나눌 때, 즉 오온(五蘊) 중에 색(色)ㆍ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의 다섯 가지 중 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인 '수상행식'을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측면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경전에서 오온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지나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색의 예를 들어 말하고서 나머지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하다는 형식으로 사용할 때 이 네 가지만을 말한다. 《반야심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는 방식의 표현이 그것이다.
우리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色受想行識)의 오온(五蘊)이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모인 것일 뿐이므로 실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미 '나'라는 것이 없으면 만법이 다 없어져 다시 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바로 근본을 돌이켜 근원, 즉 도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뿌리로 돌아간 것이다.
유교에서는 처음 태극의 치리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하고, 이곳에 이르면 말의 길이 끊으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 만약 생각을 하게 되면 곧 어긋나 버리며, 법을 잘 펴서 이리저리 적당히 꿰만추어도 옳지 않게 된다.
야보도천 스님의 "뒤로 물러서서 보라. 그러면 감각이 없는 돌이 움직인다."라는 말씀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불교는 현실을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그 속에서 깊은 진리를 보라고 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면 그 속에 담긴 진리는 보지 못하게 된다. |